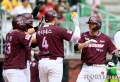대한민국 연예/스포츠/라이프 뉴스전문
- <추억의 명장면>-서스페리아
-
공포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다.
이탈리아 공포영화의 대부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<서스페리아>(1977년)는 구차한 서론을 거부한다.
시작부터 끝까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. 마치 감독이 관객들에게 '이래도 무서워하지 않을래?'하고 윽박지르는 듯 하다.
관객들은 마녀 따위가 나오는 비현실적 설정과 빈약한 각본 따윈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. 계속되는 공포에 오금이 저릴 뿐이다.
이 영화엔 단 한번도 밝은 대낮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다.
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, 시뻘건 고딕양식의 건물이 번개 사이로 비쳤다 사라졌다 한다. 영화의 초입부분이다.
그리고 곧 이어진 첫 번째 살인.<사진>
유리창 밖에서 털복숭이 손이 튀어나와 발레학교 학생의 머리채를 휘어 잡는다. 그리곤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이어진다.
유리창에 찔려 얼굴이 피범벅인 된 여학생은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비명을 지르지만 아랑곳 없이 계속되는 난도질.
심장이 칼에 찔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진다.
그러나 제2, 제3의 살인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. 갈수록 잔인하고 엽기적인 '살인 행진'이 이어진다.
<서스페리아>는 헐리우드의 공포영화와는 접근방식이 상당히 다르다.
색체와 음악과 장식.
<서스페리아>를 보고 있으면 살인 장면이 아닌데도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다. 이유는 음산한 음악과 색깔 때문이다.
빨간 벽면으로 이어진 복도에 아트락의 거장 '고블린'의 음악이 깔리는 것 자체만으로 눈을 감게 된다.
여기에 기하학적 도형과 나선형의 계단은 또다른 공포심을 조장한다.
<서스페리아>는 귀를 막고 보면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.
서울 국도극장에 친구들과 함께 아무 생각없이 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낭패를 본 기억이 떠오른다.
몇 번이나 중간에 나가고 싶었지만 '남자 체면' 때문에 눌러 앉아 있어야 했던 괴로움.
집에 돌아온 뒤에도 한참 동안 <서스페리아>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밤잠을 설쳤다.
특히 썩은 시체위에 우글거리던 구더기가 왜 그렇게 떠오르던지. 하여튼 너무 무서운 영화다.
마지막에 주인공 수지(제시카 하퍼)에게 죽는 마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. 바로 <제3의 사나이>에서 청초하고 차가운 미모를 발산했던 알리다 발리다. (김대호/news@photoro.com) 이전글 다음글
전체보기 기사목록
전체보기 인기포토